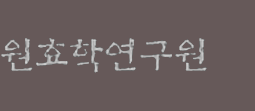기사 예술작품의 의미와 해석: 대승기신론 ①-이도흠 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10,284회 작성일 18-05-15 00:58본문
20세기 최고의 미술작품으로 손꼽힌 마르셀 뒤샹의 ‘샘’. 뒤샹은 예술에 대한 개념의 전환을 통해 공장서 제작해 낸 변기를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시켰다.
필자가 오늘 시청 앞 광장에 라면 상자를 몇 개 쌓아놓고 이를 예술이라 주장하며 수십 억 원에 경매하고자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자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앤디 워홀은 부엌 세제를 넣는 브릴로 상자를 몇 개 쌓아올려 놓고 예술이라 하였다. 지금 앤디 워홀의 작품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삼성가가 재산의 은닉 수단으로 그의 작품을 사들였을 정도로 고가에 경매되고 있다.
미술관서 추방당한 ‘20세기 최고 걸작’
20세기 최고의 미술작품은 누구의 어느 작품일까? 피카소? 마티스? 고호? 모두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인 터너 상 시상식에 모인 500여 명에 달하는 미술 전문가들이 마르셀 뒤샹의 ‘샘’을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선정하였다. 1917년 뒤샹은 변기를 하나 구입해 화실로 가져가서 거꾸로 세운 후 검정 물감으로 변기 제조자인 ‘R. Mutt’와 연도 ‘1917’을 작품에 서명하듯이 적었다. 그는 이 작품에 ‘샘’이라고 제목을 붙여 앙데팡당 전이 열리던 미국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갤러리에 출품하였다. 미술관의 위원회는 논란을 벌인 끝에 이 작품을 전시회에서 추방하였다.
뒤샹이 한 것은 공장에서 변기를 구입해 서명을 하고 미술관에 가져다 놓은 것뿐이다. 공장에서 찍어낸 변기가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을까? 하나는 ‘작가의 의도와 그 작품에 담긴 메시지’ 때문이다. 기존에 예술이란 위대한 정신과 영혼, 남다른 상상력을 지닌 작가가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무엇이었다. 뒤샹은 이에 도전하였다. 그는 예술이 창조의 작업이고 예술가가 창조자라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였다.
추한 것, 공산품도 예술가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놓인 위상에 따라 얼마든 예술이 될 수 있다. 예술가는 창조자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선택자’일 수도 있다. 그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소재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느 장소에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한다.
작가의 의도와 작품에 담긴 진리가 고귀하고 심오하면 예술이 되는가. 아니다. 아무리 성인의 진리에 필적하는 의미가 작품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창작행위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다. 뒤샹이 자신의 작품을 인정해주는 비평가와 예술이론, 사회문화의 새로운 흐름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3류 작가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그의 작품은 처음엔 조롱당하였고 미술관에서 추방당하였다. ‘샘’은 지금 사진으로만 남아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술계, 비평계, 시대는 그를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미술가, 현대 예술작품이 더 이상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개념적으로 바꾸어 놓는 무엇으로 전환하게 한 전위적인 예술가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무엇을 예술로 만드는 것은 ‘객관적 맥락’, 구체적으로 말하여 그것을 예술로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비평가,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는 예술이론, 이런 비평과 이론에 기대고 있는 집단과 제도, 그리고 시대문화적 배경이다.
객관적 맥락도 실은 ‘주관적 해석이 어우러져 형성한 장’이다. 들판 구석에 홀로 핀 국화꽃을 외롭다고 노래하는 것은 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라고 운운하는 것만큼이나 상투적이다. 예술은 상투성에 반역을 일으키는 것, 곧 ‘낯설게하기(estrangement)’를 본령으로 한다.
이 작품을 대하면 우리는 우선 변기가 어떻게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목 ‘샘’과 변기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 “더러운 변기도 얼마든 아름다운 샘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인가, 변기에서 소변을 보며 새로운 상상이 샘솟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제 이 변기로 모든 것이 쓸려나가고 새로운 개념의 예술이 샘솟을 것이란 뜻에서 그런 것인가?”하며 나름대로 작품을 해석할 것이다.
변기를 배수관으로부터 제거하자 소변을 모아 정화조로 이동시킨다는 변기의 실용적 기능과 의미 또한 사라지고 이 소재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다. 무엇으로 생각하든, ‘샘’의 낯설게하기가 보여준 반역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술에 대한 개념 자체에 혁신을 가져왔다. 예술작품과 일상용품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런 해석들이 모여 기존의 비평과 이론, 이를 바탕으로 한 집단에 틈을 내 버렸다. 결국에는 ‘샘’의 독창성에 찬사를 보내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의미로 풀어내는 비평과 이론, 그를 바탕으로 한 집단을 창조해 낸 것이다.(이상, 아서 단토의 좬일상적인 것의 변용좭에서 시사를 받음)
‘작가의 의도와 작품 속에 담긴 진리, 객관적 맥락, 해석의 장’이 어느 것을 예술로 결정하는 세 요소다. 그럼 어떤 것을 예술로 결정하는 근거가 불교철학에 있는가.
마명(馬鳴)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가운데 체용론을 응용하면 종교와 예술, 진리와 작품, 예술의 창작과 수용과 텍스트의 관계를 하나로 아울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명은 대승철학을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로 체계화한다. 그는 좬대승기신론좭의 「입의분(立義分)」에서 “첫째는 체대(體大)이니 일체 법이 진여 평등하여 더하고 덜하지 않는 까닭이요, 둘째는 상대(相大)이니 여래장이 한량이 없는 성공덕(性功德)을 구족(具足)한 까닭이요, 셋째는 용대(用大)이니 능히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착한 인과(因果)를 낳는 까닭이다.”라 주장한다.
불성 간직한 중생심이 ‘체(體)’
이어서 그는 「해석분(解釋分)」에서 이를 구체화한다. “또한 진여의 자체상이라는 것은 일체의 범부, 성문, 벽지불, 보살, 모든 부처에게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으며 과거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미래에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필경 늘 본래부터 이미 오는 것으로 성품이 스스로 일체의 공덕을 가득 채운 것이다.
이른바 자체에 대지혜광명(大智慧光明)의 뜻이 있는 까닭이며, 법계에 두루 비추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진실로 안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뜻이 있는 까닭이며, 청량하고 변하지 않는 자재(自在)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갠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많게, 여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불사의한 불법을 구족하여 이에 만족함에 이르러 조금도 부족한 바가 없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까닭으로 이를 여래장이라 하며, 또한 이름을 여래법신이라 하는 것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일심엔 둘이 있으니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이며, 진여문에 체대(體大), 생멸문에 용대(用大)와 상대(相大)를 둔다. 천지만물엔 모두 체상용, 이 셋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연필통의 체(體)는 ‘나무의 속성’이다. 연필통은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불에 넣으면 타버리고 물에 던지면 뜨며 조각칼을 갖다 대면 잘 파져 거기에 난이나 꽃을 새길 수도 있다. 속이 빈 둥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상(相)이다. 그 통에 연필과 필기구를 넣어 보관하는 것은 용(用)이다.
나무의 속성은 시간에 따라, 필통이 놓인 자리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나무로 무엇을 만들든, 나무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 필통을 만들면 필통이 발생하고 존재하지만, 나무의 속성은 필통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냥 있던 것이다. 이처럼, 체(體)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없이 늘 변함이 없으며 발생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아닌, 위대한 지혜의 빛을 두루 밝게 온 세상에 뿌리는 대지혜광명(大智慧光明)이다.
이를 사람에게 가져오면 체는 중생심(衆生心)이다. 왜 중생심인가. 중생은 원래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리창에 먼지가 끼면 하늘이 더럽게 보이는 것처럼 무명(無明)에 물들었기 때문에 허망한 것과 삿된 것에 기울어지고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유리창의 먼지만 닦아내면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무명만 없애면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된다. 그러니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푸른 하늘처럼, 체는 일체의 더러움과 허망함과 삿된 생각을 떠나서 무명(無明)도 없고 번뇌도 없이 스스로 청정한 마음에 이른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다.
나무 필통에도 나무의 속성은 그대로
체는 무한한 시간을 통하여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도 없으며 늘거나 줄지도 않으니 상(常)이며, 조금의 망상이나 미혹함이 없기에 집착도 없고 그러니 고통 또한 없이 무위(無爲)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계이며, 자성(自性)이 청정하여 망집(妄執)의 아(我)와 연기의 사슬에서 벗어나니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진아(眞我)가 있으며, 일체의 더러운 번뇌가 말끔히 사라져 늘 청정하다. 한마디로 종합하여 체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세계다.
망념과 미혹함이 없이 과보로 인한 발생과 소멸도 없이 늘 청량하여 변하지 않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이 통하고 아무런 속박이 없이 두루 언제나 자유로우니 청량불변자재(淸凉不變自在)의 세계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체는 모든 분별을 여의고 장애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모든 허망함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지극히 청정하고 모든 고통을 여위어 한없이 즐거운 궁극의 세계이다.
나무를 깎아 필통을 만들 수도 있고, 의자를 제작할 수도 있으며, 목불상을 형상화할 수도 있다. 그것이 나무의 다양한 형상이지만 나무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 중생이 상황에 따라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중생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생의 마음은 본래 여여(如如)하다. 무한한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어떤 공간에 자리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다. 그처럼 중생심(衆生心)에 바로 진여(眞如)의 체가 있으니 원인으로는 여래장(如來藏)이 있기 때문이요, 결과로는 여래장법신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여래장 중에 한량이 없는 성공덕(性功德)을 드러내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대(相大)이다.
나무를 깎아 필통을 만들면 필통은 연필이나 필기구를 보관하는 구실을 하며, 의자는 사람이 앉는 도구로 사용되며, 목불상은 부처의 진리를 담는다. 중생은 망상에 현혹되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일심(一心)의 본원(本源)으로 돌아와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고통스런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베풀 수도 있다. 이 여래장의 불가사의한 업용(業用)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용대(用大)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진여가 일으킨 염상(染相)을 상(相)이라 이름하고, 진여가 일으킨 정용(淨用)을 용(用)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체가 법신(法身)이라면, 상은 보신(報身)이며, 용은 응신(應身)이다.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도흠
출처:법보신문
필자가 오늘 시청 앞 광장에 라면 상자를 몇 개 쌓아놓고 이를 예술이라 주장하며 수십 억 원에 경매하고자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자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앤디 워홀은 부엌 세제를 넣는 브릴로 상자를 몇 개 쌓아올려 놓고 예술이라 하였다. 지금 앤디 워홀의 작품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삼성가가 재산의 은닉 수단으로 그의 작품을 사들였을 정도로 고가에 경매되고 있다.
미술관서 추방당한 ‘20세기 최고 걸작’
20세기 최고의 미술작품은 누구의 어느 작품일까? 피카소? 마티스? 고호? 모두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인 터너 상 시상식에 모인 500여 명에 달하는 미술 전문가들이 마르셀 뒤샹의 ‘샘’을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선정하였다. 1917년 뒤샹은 변기를 하나 구입해 화실로 가져가서 거꾸로 세운 후 검정 물감으로 변기 제조자인 ‘R. Mutt’와 연도 ‘1917’을 작품에 서명하듯이 적었다. 그는 이 작품에 ‘샘’이라고 제목을 붙여 앙데팡당 전이 열리던 미국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갤러리에 출품하였다. 미술관의 위원회는 논란을 벌인 끝에 이 작품을 전시회에서 추방하였다.
뒤샹이 한 것은 공장에서 변기를 구입해 서명을 하고 미술관에 가져다 놓은 것뿐이다. 공장에서 찍어낸 변기가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을까? 하나는 ‘작가의 의도와 그 작품에 담긴 메시지’ 때문이다. 기존에 예술이란 위대한 정신과 영혼, 남다른 상상력을 지닌 작가가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무엇이었다. 뒤샹은 이에 도전하였다. 그는 예술이 창조의 작업이고 예술가가 창조자라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였다.
추한 것, 공산품도 예술가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놓인 위상에 따라 얼마든 예술이 될 수 있다. 예술가는 창조자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선택자’일 수도 있다. 그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소재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느 장소에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한다.
작가의 의도와 작품에 담긴 진리가 고귀하고 심오하면 예술이 되는가. 아니다. 아무리 성인의 진리에 필적하는 의미가 작품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창작행위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다. 뒤샹이 자신의 작품을 인정해주는 비평가와 예술이론, 사회문화의 새로운 흐름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3류 작가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그의 작품은 처음엔 조롱당하였고 미술관에서 추방당하였다. ‘샘’은 지금 사진으로만 남아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술계, 비평계, 시대는 그를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미술가, 현대 예술작품이 더 이상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개념적으로 바꾸어 놓는 무엇으로 전환하게 한 전위적인 예술가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무엇을 예술로 만드는 것은 ‘객관적 맥락’, 구체적으로 말하여 그것을 예술로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비평가,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는 예술이론, 이런 비평과 이론에 기대고 있는 집단과 제도, 그리고 시대문화적 배경이다.
객관적 맥락도 실은 ‘주관적 해석이 어우러져 형성한 장’이다. 들판 구석에 홀로 핀 국화꽃을 외롭다고 노래하는 것은 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라고 운운하는 것만큼이나 상투적이다. 예술은 상투성에 반역을 일으키는 것, 곧 ‘낯설게하기(estrangement)’를 본령으로 한다.
이 작품을 대하면 우리는 우선 변기가 어떻게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목 ‘샘’과 변기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 “더러운 변기도 얼마든 아름다운 샘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인가, 변기에서 소변을 보며 새로운 상상이 샘솟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제 이 변기로 모든 것이 쓸려나가고 새로운 개념의 예술이 샘솟을 것이란 뜻에서 그런 것인가?”하며 나름대로 작품을 해석할 것이다.
변기를 배수관으로부터 제거하자 소변을 모아 정화조로 이동시킨다는 변기의 실용적 기능과 의미 또한 사라지고 이 소재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다. 무엇으로 생각하든, ‘샘’의 낯설게하기가 보여준 반역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술에 대한 개념 자체에 혁신을 가져왔다. 예술작품과 일상용품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런 해석들이 모여 기존의 비평과 이론, 이를 바탕으로 한 집단에 틈을 내 버렸다. 결국에는 ‘샘’의 독창성에 찬사를 보내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의미로 풀어내는 비평과 이론, 그를 바탕으로 한 집단을 창조해 낸 것이다.(이상, 아서 단토의 좬일상적인 것의 변용좭에서 시사를 받음)
‘작가의 의도와 작품 속에 담긴 진리, 객관적 맥락, 해석의 장’이 어느 것을 예술로 결정하는 세 요소다. 그럼 어떤 것을 예술로 결정하는 근거가 불교철학에 있는가.
마명(馬鳴)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가운데 체용론을 응용하면 종교와 예술, 진리와 작품, 예술의 창작과 수용과 텍스트의 관계를 하나로 아울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명은 대승철학을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로 체계화한다. 그는 좬대승기신론좭의 「입의분(立義分)」에서 “첫째는 체대(體大)이니 일체 법이 진여 평등하여 더하고 덜하지 않는 까닭이요, 둘째는 상대(相大)이니 여래장이 한량이 없는 성공덕(性功德)을 구족(具足)한 까닭이요, 셋째는 용대(用大)이니 능히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착한 인과(因果)를 낳는 까닭이다.”라 주장한다.
불성 간직한 중생심이 ‘체(體)’
이어서 그는 「해석분(解釋分)」에서 이를 구체화한다. “또한 진여의 자체상이라는 것은 일체의 범부, 성문, 벽지불, 보살, 모든 부처에게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으며 과거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미래에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필경 늘 본래부터 이미 오는 것으로 성품이 스스로 일체의 공덕을 가득 채운 것이다.
이른바 자체에 대지혜광명(大智慧光明)의 뜻이 있는 까닭이며, 법계에 두루 비추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진실로 안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뜻이 있는 까닭이며, 청량하고 변하지 않는 자재(自在)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갠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많게, 여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불사의한 불법을 구족하여 이에 만족함에 이르러 조금도 부족한 바가 없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까닭으로 이를 여래장이라 하며, 또한 이름을 여래법신이라 하는 것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일심엔 둘이 있으니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이며, 진여문에 체대(體大), 생멸문에 용대(用大)와 상대(相大)를 둔다. 천지만물엔 모두 체상용, 이 셋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연필통의 체(體)는 ‘나무의 속성’이다. 연필통은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불에 넣으면 타버리고 물에 던지면 뜨며 조각칼을 갖다 대면 잘 파져 거기에 난이나 꽃을 새길 수도 있다. 속이 빈 둥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상(相)이다. 그 통에 연필과 필기구를 넣어 보관하는 것은 용(用)이다.
나무의 속성은 시간에 따라, 필통이 놓인 자리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나무로 무엇을 만들든, 나무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 필통을 만들면 필통이 발생하고 존재하지만, 나무의 속성은 필통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냥 있던 것이다. 이처럼, 체(體)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없이 늘 변함이 없으며 발생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아닌, 위대한 지혜의 빛을 두루 밝게 온 세상에 뿌리는 대지혜광명(大智慧光明)이다.
이를 사람에게 가져오면 체는 중생심(衆生心)이다. 왜 중생심인가. 중생은 원래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리창에 먼지가 끼면 하늘이 더럽게 보이는 것처럼 무명(無明)에 물들었기 때문에 허망한 것과 삿된 것에 기울어지고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유리창의 먼지만 닦아내면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무명만 없애면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된다. 그러니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푸른 하늘처럼, 체는 일체의 더러움과 허망함과 삿된 생각을 떠나서 무명(無明)도 없고 번뇌도 없이 스스로 청정한 마음에 이른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다.
나무 필통에도 나무의 속성은 그대로
체는 무한한 시간을 통하여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도 없으며 늘거나 줄지도 않으니 상(常)이며, 조금의 망상이나 미혹함이 없기에 집착도 없고 그러니 고통 또한 없이 무위(無爲)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계이며, 자성(自性)이 청정하여 망집(妄執)의 아(我)와 연기의 사슬에서 벗어나니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진아(眞我)가 있으며, 일체의 더러운 번뇌가 말끔히 사라져 늘 청정하다. 한마디로 종합하여 체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세계다.
망념과 미혹함이 없이 과보로 인한 발생과 소멸도 없이 늘 청량하여 변하지 않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이 통하고 아무런 속박이 없이 두루 언제나 자유로우니 청량불변자재(淸凉不變自在)의 세계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체는 모든 분별을 여의고 장애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모든 허망함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지극히 청정하고 모든 고통을 여위어 한없이 즐거운 궁극의 세계이다.
나무를 깎아 필통을 만들 수도 있고, 의자를 제작할 수도 있으며, 목불상을 형상화할 수도 있다. 그것이 나무의 다양한 형상이지만 나무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 중생이 상황에 따라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중생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생의 마음은 본래 여여(如如)하다. 무한한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어떤 공간에 자리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다. 그처럼 중생심(衆生心)에 바로 진여(眞如)의 체가 있으니 원인으로는 여래장(如來藏)이 있기 때문이요, 결과로는 여래장법신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여래장 중에 한량이 없는 성공덕(性功德)을 드러내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대(相大)이다.
나무를 깎아 필통을 만들면 필통은 연필이나 필기구를 보관하는 구실을 하며, 의자는 사람이 앉는 도구로 사용되며, 목불상은 부처의 진리를 담는다. 중생은 망상에 현혹되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일심(一心)의 본원(本源)으로 돌아와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고통스런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베풀 수도 있다. 이 여래장의 불가사의한 업용(業用)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용대(用大)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진여가 일으킨 염상(染相)을 상(相)이라 이름하고, 진여가 일으킨 정용(淨用)을 용(用)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체가 법신(法身)이라면, 상은 보신(報身)이며, 용은 응신(應身)이다.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도흠
출처:법보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