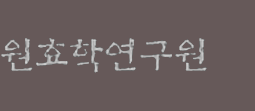설화 및 전설 광덕과 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10,448회 작성일 18-05-15 00:50본문
<경주·분황사>
신라 문무왕 때 광덕과 엄장이란 두 스님이 있었다. 이 스님들은 네것 내것을 가리지 않을 만큼 몹시 절친한 사이여서 공부하면서도 서로 알려주고 도우면서 성불을 향해 정진했다.
『자네가 먼저 극락에 가게 되면 반드시 알리고 가야 하네.』
『물론이지 이 사람아. 자네도 마찬가질세.』
두 스님은 밤낮으로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약속하면서 사이좋게 공부를 겨뤘다.
분황사 서리에 숨어 신 삼는 것을 업으로 살고 있던 광덕 스님은 부인을 거느렸는데 그의 처는 분황사 노비였다.
엄장 스님은 남악에 암자를 짓고 숲의 나무를 벤 후 밭을 일궈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엄장 스님은 저녁공양과 예불을 마친 뒤 집 주위를 산책하고 있었다.
석양에 물든 하늘빛은 아름답기 그지없었고, 초여름 저녁 미풍에 날리는 송화가루는 싱그러움을 더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한 줄기 밝은 빛이 땅까지 비추더니 광덕 스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서쪽으로 가니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오라.』
엄장 스님은 얼른 하늘을 쳐다봤다. 구름 속에선 신비스런 하늘의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 엄장 스님이 광덕 스님이 살고 있는 서리로 가보니 과연 광덕 스님은 열반에 들어 있었다.
『언제 가셨습니까?』
『어제 저녁 석양 무렵에 가셨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광덕 스님의 우정 어린 마지막 인사를 들은 엄장은 그 부인과 함께 유해를 거두어 다비식을 치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엄장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스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셔야지요.』
『네. 그런데 부인 혼자 두고 가려니 왠지 마음이 안되어서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혼자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염려마옵시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혼자인들 어떻고 반쪽이면 어떻습니까?』
엄장은 일어설 생각을 않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부인, 부인께서도 알다시피 광덕과 저는 서로 가릴 것 없는 절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가 먼저 서쪽으로 갔으니 그와 살았듯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그렇게 하시지요. 광덕 스님 섬기듯 성심껏 시봉하겠습니다.』
광덕의 처가 거리낌없이 선뜻 답하자 엄장 스님은 약간 의외이긴 했으나 쉽게 뜻을 이루어 기분이 좋았다.
그날 밤, 밤이 깊어 두 사람은 각각 잠자리에 들었다.
엄장이 그 부인 곁으로 다가가 잠자리를 함께 하려 하자 부인은 놀라는 기색으로 말했다.
『스님이 서방극락을 구함은 마치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장은 의아했다. 초저녁, 선뜻 함께 살기를 응낙하던 부인의 못브이 마치 고승의 준엄한 자태로 바쳐왔기 때문이다. 엄장은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일었으나 마음을 굳게 다잡고 다시 물었다.
『광덕도 이미 수년간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고 안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남편은 10여 년이나 저와 동거했으나 하루 저녁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단정히 앉아 한결같이 아미타불 명호를 부르거나 16관(아미타경에 설해진 대로 태양과 물 등 16가지 일을 명상하는 관법)을 하며 정진했습니다. 또 밝은 달빛이 창에 비쳐들 때면 그 빛을 타고 가부좌를 틀었으니 어찌 미혹을 깨고 서방극락에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엄장은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일 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대개 천 리를 가는 사람은 그 첫걸음으로써 알 수 있는데, 지금 스님의 생각이 동쪽에 있으니 서방은 미처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엄장은 부끄러워 더이상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부인에게 큰절을 올렸다.
『아니, 스님 왜 이러십니까?』
『몰라뵈옵고 무례했던 점 널리 용서하옵소서.』
엄장은 부인에게 크게 사죄한 후 날이 새자마자 분황사로 달려가 원효 스님에게 간밤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고한 후 가르침을 청했다.
원효 스님은 쟁관법(징을 치면서 산란한 생각을 없애며 선정에 들게 하는 특수 관법으로 추측되고 있다)을 일러줬다.
엄장은 그 길로 남악 암자로 돌아왔다. 그 동안 자신의 공부가 헛되었음을 절감하면서 그는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공부에 임했다. 엄장 스님은 오직 한마음으로 관(觀)을 닦았다.
몇 년이 지난 어느 초여름 해질 무렵, 엄장 역시 광덕 스님처럼 극락왕생했다.
광덕 스님의 부인은 비록 분황사 노비였지만 사실은 관음의 19응신중의 하나였다.
분황사에는 광덕과 엄장 스님을 깨우친 관음응신 이야기 외에 희명의 아이가 눈을 뜨게 한 천수관음의 영험담도 오래도록 전래되고 있다.
경덕왕 때 한기리에 사는 희명의 아이가 난 지 5년만에 눈이 멀었다. 희명과 그 아이는 분황사 좌전 북쪽에 있었다는 천수관음 앞에서 향가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빌었다.
무릎을 곧추며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 앞에
비옴을 두나이다
즈믄 손 즈믄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더옵기
둘 없는 내라
하나로 그윽히 고쳐질 것이라
아아! 나에게 끼쳐 주시면
놓저 쓸 자비여 얼마나 큰고
희명의 아이가 눈을 뜨자 그 후 분황사 인근 백성들을 이곳을 찾아 행복을 빌었다.
<현대불교미디어센터 ⓒ 2006>
신라 문무왕 때 광덕과 엄장이란 두 스님이 있었다. 이 스님들은 네것 내것을 가리지 않을 만큼 몹시 절친한 사이여서 공부하면서도 서로 알려주고 도우면서 성불을 향해 정진했다.
『자네가 먼저 극락에 가게 되면 반드시 알리고 가야 하네.』
『물론이지 이 사람아. 자네도 마찬가질세.』
두 스님은 밤낮으로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약속하면서 사이좋게 공부를 겨뤘다.
분황사 서리에 숨어 신 삼는 것을 업으로 살고 있던 광덕 스님은 부인을 거느렸는데 그의 처는 분황사 노비였다.
엄장 스님은 남악에 암자를 짓고 숲의 나무를 벤 후 밭을 일궈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엄장 스님은 저녁공양과 예불을 마친 뒤 집 주위를 산책하고 있었다.
석양에 물든 하늘빛은 아름답기 그지없었고, 초여름 저녁 미풍에 날리는 송화가루는 싱그러움을 더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한 줄기 밝은 빛이 땅까지 비추더니 광덕 스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서쪽으로 가니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오라.』
엄장 스님은 얼른 하늘을 쳐다봤다. 구름 속에선 신비스런 하늘의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 엄장 스님이 광덕 스님이 살고 있는 서리로 가보니 과연 광덕 스님은 열반에 들어 있었다.
『언제 가셨습니까?』
『어제 저녁 석양 무렵에 가셨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광덕 스님의 우정 어린 마지막 인사를 들은 엄장은 그 부인과 함께 유해를 거두어 다비식을 치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엄장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스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셔야지요.』
『네. 그런데 부인 혼자 두고 가려니 왠지 마음이 안되어서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혼자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염려마옵시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혼자인들 어떻고 반쪽이면 어떻습니까?』
엄장은 일어설 생각을 않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부인, 부인께서도 알다시피 광덕과 저는 서로 가릴 것 없는 절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가 먼저 서쪽으로 갔으니 그와 살았듯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그렇게 하시지요. 광덕 스님 섬기듯 성심껏 시봉하겠습니다.』
광덕의 처가 거리낌없이 선뜻 답하자 엄장 스님은 약간 의외이긴 했으나 쉽게 뜻을 이루어 기분이 좋았다.
그날 밤, 밤이 깊어 두 사람은 각각 잠자리에 들었다.
엄장이 그 부인 곁으로 다가가 잠자리를 함께 하려 하자 부인은 놀라는 기색으로 말했다.
『스님이 서방극락을 구함은 마치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장은 의아했다. 초저녁, 선뜻 함께 살기를 응낙하던 부인의 못브이 마치 고승의 준엄한 자태로 바쳐왔기 때문이다. 엄장은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일었으나 마음을 굳게 다잡고 다시 물었다.
『광덕도 이미 수년간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고 안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남편은 10여 년이나 저와 동거했으나 하루 저녁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단정히 앉아 한결같이 아미타불 명호를 부르거나 16관(아미타경에 설해진 대로 태양과 물 등 16가지 일을 명상하는 관법)을 하며 정진했습니다. 또 밝은 달빛이 창에 비쳐들 때면 그 빛을 타고 가부좌를 틀었으니 어찌 미혹을 깨고 서방극락에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엄장은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일 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대개 천 리를 가는 사람은 그 첫걸음으로써 알 수 있는데, 지금 스님의 생각이 동쪽에 있으니 서방은 미처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엄장은 부끄러워 더이상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부인에게 큰절을 올렸다.
『아니, 스님 왜 이러십니까?』
『몰라뵈옵고 무례했던 점 널리 용서하옵소서.』
엄장은 부인에게 크게 사죄한 후 날이 새자마자 분황사로 달려가 원효 스님에게 간밤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고한 후 가르침을 청했다.
원효 스님은 쟁관법(징을 치면서 산란한 생각을 없애며 선정에 들게 하는 특수 관법으로 추측되고 있다)을 일러줬다.
엄장은 그 길로 남악 암자로 돌아왔다. 그 동안 자신의 공부가 헛되었음을 절감하면서 그는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공부에 임했다. 엄장 스님은 오직 한마음으로 관(觀)을 닦았다.
몇 년이 지난 어느 초여름 해질 무렵, 엄장 역시 광덕 스님처럼 극락왕생했다.
광덕 스님의 부인은 비록 분황사 노비였지만 사실은 관음의 19응신중의 하나였다.
분황사에는 광덕과 엄장 스님을 깨우친 관음응신 이야기 외에 희명의 아이가 눈을 뜨게 한 천수관음의 영험담도 오래도록 전래되고 있다.
경덕왕 때 한기리에 사는 희명의 아이가 난 지 5년만에 눈이 멀었다. 희명과 그 아이는 분황사 좌전 북쪽에 있었다는 천수관음 앞에서 향가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빌었다.
무릎을 곧추며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 앞에
비옴을 두나이다
즈믄 손 즈믄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더옵기
둘 없는 내라
하나로 그윽히 고쳐질 것이라
아아! 나에게 끼쳐 주시면
놓저 쓸 자비여 얼마나 큰고
희명의 아이가 눈을 뜨자 그 후 분황사 인근 백성들을 이곳을 찾아 행복을 빌었다.
<현대불교미디어센터 ⓒ 2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